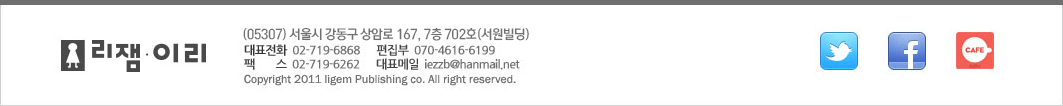『처음 흔들렸다』
콩자반처럼 까맣게 조려 놓은 세상을 등지고
처음 연애를 걸듯 떠난, 시인 홍성식의 세계여행기!

말뚝에 묶인 염소처럼 목줄이 닿는 거리만큼 삶을 영유하다가 지리멸렬 쓸쓸하게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노동의 강도가 클수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출근길에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가도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릿속에 지구본을 올려놓는 순간, 그저 까마득하다. 섣불리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내 말뚝에 다른 누군가가 밥그릇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전 지구적으로 미아가 될 공산이 크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10년간 잘 다니던 회사를 떠나
이 책 <처음 흔들렸다>의 저자 홍성식 시인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한 계좌에 몰아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동산 중개소에 전셋집을 내놓았다. 집이 나가고 전세금마저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지인에게 약간의 돈까지 빌린 다음, 시인은 비행기에 올랐다. 금지된 모든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 허공을 치솟는 비행기에 자신을 던진 셈이었다.
홍성식 시인은 태국을 경유해서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그에게 여행지에서의 의미는 깊은 잠이었다. 그는 서두르는 법 없이 푹 잠을 잤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깨어나서 그 동네 청년처럼 청바지에 티 하나 걸치고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다. 많게는 한 달 동안 사람들로 북적대는 길가에 방을 얻어 잠을 자기도 했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 밤새 술을 마셨다. 술이 깨면 수영을 하기도 했고, 수영이 지겨우면 다시 술을 마셨다. 퇴직금에 전세금까지 탈탈 덜어서 온 여행자치고는 여유가 느껴지는 생활이었다. 다음 여행지에 대한 계획도 정보도 없고, 돌아갈 계획도 없는, 마치 자신과 사별하고야 말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 코끼리 똥처럼 바람에 날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무의미한 이방인같이.
애당초 시인이 생각한 여행은 이런 것이었다. 오랫동안 농기구처럼 부려먹어서 경직되고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영혼을 한없이 풀어놓는 것, 햇빛에 늘어놓는 것.
태국에서 시인은 탁발승을 만났다. 서울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외감을 거기서 처음 만났다. 고개를 숙이는 자신을 발견했고, 스스로를 매질하는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대적인 아픔을 체득하며 속을 썩일 줄도 알았다.

처음, 흔들렸다
태국을 지나 베트남, 라오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란,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카타르를 거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10개월 동안 시인 홍성식은 여행을 다녔다.
캄보디아에서는 앙코르와트를 마주하고, 베트남 나쨩에선 온종일 바다 위를 둥둥 떠다녔다. 왕복 천원으로 태국의 카오산 로드를 투어하고, 라오스의 새벽 탁발승 앞에 무릎 꿇었다. 터키의 소금호수에서 설원을 만끽하고, 2,500년 전에 세워진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앞에 서 있기도 했다. 마케도니아의 호수 도시인 오흐리드에서 보름 동안 머물고, 알바니아에선 국경을 넘은 사람을 목격했다. 몬테네그로의 코토르에서 낭만과 폐허의 공존을 마주하고, 세르비아의 사라예보에선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밭을 보았다.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해에 취했고,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 예술과 사랑에 빠졌고, 이탈리아에서는 조그만 화산암을 샀다.
지나온 길을 되짚어 가기를 수차례, 그는 결코 다시 돌아올 걸 염두해 두지 않았다. 서울에 둔 모든 인연들이 현세의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발걸음도 가벼웠고, 그래서 더 멀리, 남들이 피해 다니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 걷고 또 걸었다. 그러면서 시인이 체득한 건 욕망하는 기관들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다. 기관들은 변죽이 심해서 불쑥불쑥 뻗어나가기도 했고, 의지를 단번에 꺾어놓기도 했다.
내가 그랬지. / 익숙한 것들은 재수가 없다고 / 익숙한 땅에는 비마저도 꼿꼿이 서서 / 자란다고. / 그래서 두통이 생긴 거야. / 내 말이 맞았어. / 내가 그랬지. / 현기증이 날 거라고 / 나비처럼 / 현기증이 날 거라고 / 놀랍지도 않은 일에도 비명을 지를 거라고 / 세상에!
바다에 떠 있거나 햇살이 드리운 방에 혼자 누워 있는 것. 이제 되돌아갈 곳도,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종자돈도 없는, 그래서 스스로 욕망을 부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 경지, 도달할 수 없는 바닥.
그 바닥에서 시인은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배로 흘러온 욕망하는 것들이 배로 흘러가버리는, 삶과 죽음 중 죽음에 가까운 삶으로의 시선, 하늘거리는 바람에 풀이 되어 스스로 풀냄새를 피우는 것 같은 텅 빔. 그것은 존귀한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결코 구할 수 없는 가치였다.
다시 시인은 북쪽으로 길을 잡아 걸었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농번기에 일손을 도우기도 하고, 길 옆 나무 밑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낯선 이들과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1년 초가을.
그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병원에 누워 있었다. 눈으로 색을 구분할 수 없었다. 깊은 우물 속으로 빨려드는 느낌이 그를 힘들게 했다.
40년을 살아온 한국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CT(컴퓨터 단층촬영)를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1차 검진 결과 안과전문 병원으로 가보라는 것이었다. 시인은 여러 날 병실에 누워 창문으로 스쳐지나가는, 긴밀하게 흔들리는 것들을 구경했다. 세상은 너무나 조밀하게 직조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시인은 한국을 떠나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떠돈 지 10개월 만에 로마에 잠시 머물다가 카타르의 도하를 거쳐 경상남도 마산으로 돌아왔다.
이 책, <처음 흔들렸다>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훌쩍 떠난 홍성식 시인의 흔들리는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이다.

<노동일보>와 <오마이뉴스>에서 10여 년 기자로 일했다. 2005년, 시「끝이다, 아니 시작이다」로 등단하여 시집 <아버지꽃>, 영화에세이 <내겐 너무 이쁜 그녀>, 작가 27인 인터뷰모음집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 등의 책을 썼다. 만 40세가 되던 해. 퇴직금과 전세금을 털어 아시아와 유럽을 계획 없이 떠돌았다. 그때부터 줄곧 유랑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