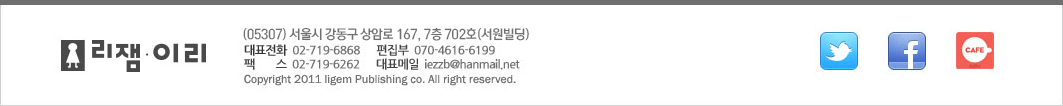<소풍>_적막 파고든 아이의 소음, 희망이 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9 17:25 조회1,443회 댓글0건본문
<소풍> 소영 지음/성원 그림
205호 아저씨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다. 밖으로는 한 발짝도 걸음 하지 않는다.
떼지 않은 전단지로 빼곡한 그의 대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것은 슈퍼마켓 아줌마가 보내오는 상자.
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담겨 있는 상자가 세상과 통하는 단 하나의 끈이다.

어느 날 밖에서 상자들이 요란하게 들썩인다. 앞집 204호에 이사 온 상자들이다.
이날부터 아저씨의 적막한 공간을 찢고 소음이 틈입한다.
“밥 달라”고, “오리 인형을 달라”고, “소풍을 가자”고.
아이의 칭얼거림과 울음은 그칠 줄 모른다.
밤에 그림을 그리고 낮에 잠을 자던 아저씨의 일상은 아이가 내는 소음으로 뒤바뀐다.
아이의 요구가 이어질 때마다 204호에는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상자가 배달된다.
상자 안은 어김없이 아이가 요구했던 것들로 채워져 있다.
달그락 달그락.
아저씨가 몰래 보낸 상자 속 재료로 김밥을 싸고 물통을 들고 소풍 길에 나서는 모녀를 아저씨는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제야 문밖의 햇살이 눈에 들어온다.
그때 문밖으로 내딛는 한 걸음.
아저씨는 엉겁결에 모녀의 소풍을 따라나선다.
햇살은 반짝이고 바람은 싱그럽고 날리는 꽃잎은 향긋하다.
아저씨의 상자에는 이 아름다운 소풍의 기억이 한가득 담긴다.
‘소음 유발자’에 불과했던 아이가 은둔형 외톨이였던 아저씨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자랄수록 ‘밖’에 대한 호기심도 커져간다.
거칠고 복잡해 두렵기만 하던 바깥세상은 어쩌면 따뜻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저씨를 스칠 때, 등을 맞댄 이웃들을 떠올리게 하는 담백한 그림책이다.
6세 이상.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서울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